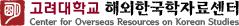홈 > 집중연구 > 고문서
고문서
-
1906년, 1910년 면주전 보용소 전장사책
이 장부들은 1906년과 1910년 보용소의 자금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장(傳掌)은 통상 물품의 인수 인계를 위해 작성한 장부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장부는 물품의 인수인계와 같은 특정 시기에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자금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었다. 보용소의 장부 작성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이루어졌다. 총 2건의 장부가 남아있다. 보용소(補用所)는 면주전의 하부조직으로,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면주전에서는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으면, 각종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왜단소와 보용소에 보내어 관리했다.
-
1907년 경성상업회의소(京城商業會議所) 관련 문서
이 문서는 20세기 초반 경성상업회의소(京城商業會議所)와 경성부(京城府)의 면주전(綿紬廛)에 관련된 문서로서 ①1907년 장헌식(張憲植)이 보낸 서간(書簡)의 피봉(皮封), ②1907년 경성박람회 협찬회 한국의원부(京城博覽會協贊會韓國議員部)에서 보낸 요청서(要請書), ③1907년 경성박람회(京城博覽會) 규칙략(規則略), ④1907년 경성상업회의소(京城商業會議所) 홍긍섭(洪肯燮) 서간(書簡), ⑤ 1907년 황태자전하봉영한성부민회(皇太子殿下奉迎漢城府民會) 회장(會長) 장헌식(張憲植) 서간(書簡) 등 총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
19세기 후반 면주전의 실태와 관련한 문서
이 문서는 대한제국 말기 면주전(綿紬廛)의 실태를 정리한 문서로서 ①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1, ②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2, ③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3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한문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면주전의 설치 연혁에서부터 조직 규모, 진배 물품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
19세기 후반 면주전의 진배가(進排價) 지급과 관련한 문서
이 문서는 19세기 후반 면주전(綿紬廛)의 진배가(進排價) 지급과 관련한 문서로서 1876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등장(等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자년(庚子年) 회계 문서
이 문서는 1900년대 초반 면주전의 회계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경자년(庚子年) 면주전(綿紬廛) 회계문기(會計文記), ②경자년(庚子年) 면주전(綿紬廛) 용하기(用下記) 등 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자년(庚子年)~계묘년(癸卯年) 면주전 치부 문서
이 문서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면주전의 회계와 관련한 문서로서 전장기(傳掌記), 전장첨지(傳掌籤紙), 전장건기(傳掌件記), 수본(手本), 회계문기(會計文記), 도중문기(都中文記), 소부기(所負記), 下帖(하첩) 등이 포함된 총 2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계묘년(癸卯年)~을사년(乙巳年) 회계 문서
이 문서는 조선후기 면주전의 운영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을사년(乙巳年) 유두분아(流頭分兒), ② 계묘년(癸卯年) 면주전(綿紬廛) 회계문기(會計文記), ③ 을사년(乙巳年) 면주전(綿紬廛) 제일방(第一房) 방세분아(房稅分兒), ④을사년(乙巳年) 이정차지접지조(釐正次知接持條), ⑤을사년(乙巳年) 백종판비(百種辦備), ⑥을사년(乙巳年) 면주전(綿紬廛) 제일방(第一房) 분아문기(分兒文記), ⑦을사년(乙巳年) 면주전(綿紬廛) 고준차지식가선상(叩準次知食價先上) 등 총 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만으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문서의 형식과 운영형태로 볼 때 19세기 문서로 추정된다.
-
군기시 약환 공인권 관련문서
본 문기는 1734년부터 1848년까지 삼남지역의 월과화약과 서북지역의 약환을 군기시에 납품한 공인에 관한 내용이다.
-
기인 명문에서만 확인되는 액정좌리(掖庭坐里)
액정좌리 혹은 기인액정좌리하고도 한다. 액정(掖庭)은 액정서를 가리키지만, 좌리(坐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본 명문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액정좌리는 액정서 기인과 관련된 공인으로 판단된다. 명문에 따르면 액정좌리의 공인권이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권을 발급하는 명문은 대부분 기인대방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인공물 주인권을 일부로 보인다.
-
기인공물의 거래 방식과 권리의 분정
기인(其人)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는 땔나무와 숯을 조달하던 공인을 가리킨다. 본래 기인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고려 왕실에서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개경에 머무르게 하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시대적 의미의 기인제도는 점차 해체되어 갔고 대동법의 실시로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다. 다만 용어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
남원양씨 준호구
남원양씨 준호구에 기재된 이들의 공통점은 양응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 '閑良'의 직역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직역으로서 '한량'은 숙종 22년(1696)부터 제도화 되었으며, 처음에는 양반의 業武者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
반남박씨 준호구
제시된 6개의 준호구는 한성부 북부에 거주하던 반남박씨 형제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1750년의 준호구는 박상덕(朴相德, 이후 朴宗德으로 개명)의 것이고, 1762년~1795년까지의 5개의 준호구는 박상악(朴相岳, 이후 朴宗岳으로 개명)의 것이다.
-
서울 성북구 돌곶이 토지 매매 관련 문서
1730년부터 1745년까지 돌곶이 소재 논 12.5마지가의 소유주 변화를 보면 내시 이(李) → 최서방댁(최수원) → 변태익 → 변태희로 15년간 총 4인의 소유를 거쳤으며 거래가는 은자 100냥 → 85냥 → 95냥으로 실제 거래 변화가 토지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
서울 성북구 돌곶이 토지매매 관련 문서
본 명문은 서울 석관동 돌곶이의 토지와 관련된 문기로 총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625년 5월 남일이 김경남에게 토지 매매. 둘째, 1629년 상전(尙傳) 박흥룡의 처 이씨가 김경남에게 토지 매매. 셋째, 1631년 겸사복 나의중의 처인 임씨기 김경남에게 토지 매매. 넷째, 1642년 김경남이 윤생원댁 호노인 한남에게 토지 매매. 다섯째, 1709년 윤생원댁 호노 영회가 염지사댁 노 명상에게 토지 매매이다.
-
서울 성북구 종암, 돌곶이 토지매매 관련 문서
본 문기는 현재 서울시 석관동과 종암동에 있었던 토지의 매매 문기이다.
-
선혜청 공사지 공인권 관련문서
본 문기는 1760년부터 1847년까지 선혜청에 공사지(公事紙) 일부를 납품할 수 있는 공인권을 매매하는 내용이다.
-
쌍강포·대장포 선여각주인 소송문서
본 문서는 김제 쌍강포와 익산 대장촌의 여각주인권을 둘러싼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대미상 고원(高原) 윤조이(尹召史) 사안
이 문서는 19세기 말 함경도 고원군에서 발생한 자액(自縊) 사건에 관한 문서로서 ①고원(高原) 윤조이(尹召史) 자액사안(自縊査案), ②고원(高原) 윤조이검제(尹召史檢題), ③고원(高原) 윤조이자액치사검안(尹召史自縊致死檢案) 계초(啓草)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액(自縊)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을 말한다. 사안(査案)은 사건을 조사하여 정리한 문서이며, 검안(檢案)은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체를 검사하고 피의자와 증인 등을 심리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
연대미상 문서편-1
이 문서는 조선후기 면주전의 운영과 관련한 문서로서 총 5건으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각들만으로 문서의 작성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조선후기 면주전의 운영방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연대미상 문서편-2
이 문서는 조선후기 면주전의 운영과 관련한 문서로서 총 8건으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각들만으로 문서의 작성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조선후기 면주전의 운영방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