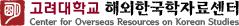홈 >
집중연구
> 금석문
금석문
-
금석문의 자료적 가치
금석문은 금속에 새겨진 금문(金文)과 돌에 새겨진 석문(石文)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금문은 금, 은, 금동, 청동, 철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각종 용기나 무기·인장·조상(造像)·범종(梵鐘) 등에 문자가 새겨진 것을 말한다.
-
조선후기 금석학의 발달
조선후기에는 금석학이 발달하였다. 그것은 서예와 골동 등 취미의 학이 발달한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금석학 발달의 제1원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가계(家系)의 사실 고증과 관련하여 금석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일문(佚文)과 교감(校勘) 자료로서의 금석문 활용
금석문 자료는 한문학사상의 주요 작가들이나 그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일문(佚文)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고려초, 중기의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비지문자(碑誌文字)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경도대본(京都大本) 『금석집첩(金石集帖)』
『금석집첩(金石集帖)』은 조선 팔도에 산재했던 각지의 금석문을 수집하여 간행한 것으로서, 수록 대상은 주로 조선시대에 건립된 비명(碑銘)의 탁본이다. 교토대 부속도서관 귀중서실에 소장된 『금석집첩』은 속편인 『금석속첩(金石續帖)』 19첩(帖)을 포함해 모두 219첩이며, 탁본의 전체 수량은 총 1,823점에 이른다.
-
금석문과 한국학
광의의 금석문은 금문, 석문, 토기 명문(銘文), 목간(木簡) 기록, 포기(布記), 묵서명(墨書銘), 칠기(漆器) 기록 묵서, 명문(銘文) 등을 포괄한다. 금석문은 문헌자료와 고고학 발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문자 기록을 의미한다.
-
탁본 자료의 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
금석문 연구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금석 유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판독과 고증·해석을 통해 기록 당시의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금석문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전체적인 파악이 힘들고,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훼손되거나 글자가 마모된 것도 적지 않다.
-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 소장 육신묘비(六臣墓碑) 탁본
육신묘비는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이 1747년(영조 23)에 작성한 「노량육신묘비명 병서(露梁六臣墓碑銘 幷序)」를 새긴 것이다. 이 비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8-2번지에 있으며, 시도유형문화재 제8호(동작구)로 지정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214cm, 너비 79cm, 두께 42cm이다. 글씨는 당나라 안진경의 글씨체를 집자했고, 비액은 ‘有明朝鮮國六臣墓碑銘’이라는 글자를 전서로 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