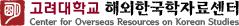홈 >
집중연구
> 고서
고서
-
문위사행(問慰使行)과 『해행기(海行記)』
조선시대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로는 크게 보아 조선 국왕이 막부장군(幕府將軍)에게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와 예조참의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파견하는 ‘문위행(問慰行)’이 있었다. 문위행은 조선 후기의 중국 사행 중 역관이 정사로 파견된 뢰자행(賚資行)에 대비된다.
-
조선시대 산과전문의학(産科專門醫學)의 발달사
조선은 국가 운영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서 생산의 주체인 인구 확대정책을 중요시했다. 부세(賦稅)와 군역(軍役)을 징발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는 의학이 필수적이었다. 세종 대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더불어 대규모 의학진흥정책이 추진되었다. 왕실과 대민의료를 담당할 삼의사(三醫司) 체제를 완비하는 한편, 조선에서 생산되는 향약의 재배와 채취에 대한 조사, 중국 의학서적의 수입 및 간행, 의서 편찬, 의학교육, 취재(取才) 등이 국가 주도하에 이뤄졌다.
-
한국경제사 연구와 고문서 활용
현재까지의 한국경제사 연구에서 고문서를 통해 경제생활의 역사에 접근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후 관계와 맥락을 짚어 냄으로써 당대인의 경제생활을 미시적으로 속속들이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 가문에서 행한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서 남긴 각종 서책, 즉 문집이나 일기를 포함한 자료들만을 통해서도 대강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재산의 변동 상황이나 각종 거래의 내역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고문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
한국한문문집을 활용한 학문연구와 정본화 방법
문집은 사회적 토대라 볼 수 있는 물질적 기반과 독서층, 가문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의 연관관계 속에서 편집되고 판각되고 유통되었다. 문집의 체제와 원 자료의 수집 방식에관한 고찰은 물론, 행권(行卷)ㆍ전사본(轉寫本)ㆍ간행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한문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평안도의 호걸 이시항(李時恒, 1672~1736)은 김경서(金景瑞)의 전기 『김장군유사(金將軍遺事)』를 집필한 인물이다. 본관은 수안(遂安), 자는 사상(士常), 호는 화은(和隱)・만은(晩隱)이다. 화은이라는 호는 고향 평양 화포(和浦)의 지명에서 따왔다.
-
동아시아에서의 ‘몽구(蒙求)’류의 유행과 속찬
중국에서는 3자구로 이루어진 『삼자경(三字經)』, 504개 성씨를 운에 맞추어 정리한 『백가성(百家姓)』, 4자구를 운에 맞추어 정리한 『천자문(千字文)』을 ‘삼백천(三百千)’이라 하여 식자(識字) 교육의 입문서로 활용하여 왔다. 또한 당나라 이한(李瀚)이 인물고사를 4자구로 정리하고 운에 맞추어 정리한 『몽구(蒙求)』도 초학자의 한문교육 교재로서 간주하였다. 이러한 교재들은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활용되었고, 각각 자국의 문화적 관습에 바탕을 두어 속찬(續撰)을 하였다.
-
고문서학과 고문서 정리사업을 위한 방법서설
고문서의 연구나 역주는 다른 문헌 자료에 대한 연구나 역주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내부 구조와 의미를 밝히는 것과 함께 텍스트 외적 의미공간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지시해주어야 한다. 근대 이전의 선인들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일생 많은 글을 읽거나 짓거나, 글이 적힌 문서에 의해 생활을 운영해 나간다. 고문서를 포함한 문헌에 관한 연구는 내용의 분석, 문체의 분류에 중점들 두게 되지만, 전통시대 문자생활의 종합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고문서 한 장의 문화사적 의미공간
고문서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료이다. ‘원소스 멀티유즈’는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새롭게 가공하거나 재창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콘텐츠 전략이다.
-
초량관어학소(草粱館語學所)의 조선어 교육법
초량관어학소의 조선어 교육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작문 교육에 복문(復文)을 도입한 점이다. 어학소의 복문 교육은 주로 조선 어원문에 대한 일본어역문이 제시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조선어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국왕 정조와 ‘공거문’ 모음집의 출현
공거문(公車文). 이 생소한 단어는 상소문을 뜻한다. 중국 한(漢) 나라에 공거부(公車府)라는 관청이 있었다.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을 접수하고, 임금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맡았다. 공거문은 바로 이 공거부라는 관청이 담당한 업무에서 유래하였다.
-
조선시대의 고악보
오늘날 우리의 고악보는 약 130여 본이 전하고 있으며, 그중 연대가 확실한 악보는 약 20여 본이 있다. 악보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16년에 송나라에서 대성아악이 수입될 때 악보가 같이 수입되었고, 고려 말까지도 문집기록에는 악보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현재 고려시대의 악보는 전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악보는 『세종실록악보』이다.
-
풍석암서실(楓石庵書屋)과 자연경실(自然經室)의 필사본
서유구의 서재로는 풍석암(楓石庵)과 자연경실(自然經室)이 있는데, 풍석암은 서유구가 젊었을 때 사용한 서재 이름이다. 서유구가 호로 사용한 ‘楓石’과 서재인 ‘楓石庵’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의 중부 서형수(徐瀅修)가 쓴 「풍석암장서기(楓石庵藏書記)」에 상세하다.
-
동아시아에서의 ‘천자문(千字文)’류의 유행과 속찬
동양 삼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된 한자한문 교재는 『천자문』이다.『천자문』은 전고(典故)가 어렵지만, 형식면에서는 4언 고시 형식을 취하면서, 대장(對仗), 압운(押韻), 연면자(連綿字)를 활용하고 일정 주제마다 단락을 이루도록 하여 한자한문 공부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해서(楷書), 초서(草書), 전서(篆書)로 필사되거나 합본되어 서체의 교본으로 이용되어 왔다.
-
대마도의 한어(韓語) 교육과 나카무라쇼지로의 활동
일본 동경대의 오구라문고(小倉文庫)에는 다수의 한어(韓語)학습서가 있다. ‘한어’란 조선 후기 대마도에서 ‘조선어’를 일컫던 말이다. 이 한어학습서들은 대부분은 대마도의 통사를 지낸 나카무라쇼지로[中村庄次郞 1855-1932]가 오구라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에게 기증한 책들이다.
-
조선시대의 병서
병서는 전근대 ‘병(兵)’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으로, 전쟁 이론과 전쟁 경험 등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체계화시킨 군사 관련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여러 전투 경험과 군사 연구자들이 연구한 전쟁 이론을 바탕으로 향후 군대가 사용할 전술과 무기 체계, 군사 제도, 군사 이론 등 군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 관계 전문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선과 일본의 의학서적 교류
일본은 사회문화 전반에서 중국과 한국의 영향을 받아왔고 중국과의 교류에서도 한국을 매개로 한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 최초로 중국 의학서가 전해진 것은 561년 오나라의 왕자 지총(知聰)이 의서 164권을 가지고 일본에 간 때이다. 이때 지총은 고구려를 거쳐 일본에 갔다. 1636년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특별히 의학지식을 자문해 줄 의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전문의학서 출현의 역사
10세기 경 동아시아에서 종이의 대량 생산과 인쇄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집안에서 혹은 의료인들 사이에서 비전(秘傳)되어 오던 의학기술은 책이라는 형태로 공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책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기록이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으나 책이 보편화된 후로는 책 자체가 사회문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
세책본(貰冊本) 소설의 이해
세책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세책점에서 빌려주던 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세책점과 세책본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상품 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인구의 확대가 뒤따라야 했고, 18세기의 인물인 채제공(蔡濟恭)과 이덕무(李德懋)가 세책본의 폐해를 거론한 것을 본다면 적어도 조선시대였던 18세기 전후로 세책점과 세책본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
방각본(坊刻本) 소설의 이해
방각본이란 용어는 중국(中國)의 남송(南宋)과 북송(北宋) 때에 “서방(書坊)․서사(書肆)․서림(書林)” 등으로 불리던 현재의 상업출판사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구매 수요가 많았던 경서(經書), 과거시험을 위한 수험서적,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의학서와 같은 것들을 목판(木板)으로 제작하여 판매했던 책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방각본은 이윤 추구를 위하여 대량 공급의 목적으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양문고 소장 한국어학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한국어사 관련 자료에는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 많다. 특히 『이문잡례(吏文襍例)』, 『음운편휘(音韻編彙)』, 『이두편람(吏讀便覽)』의 3종이 주목된다. 『이문잡례』는 조선 후기 문서서식집 겸 이두학습서로서 현재 알려져 있는 유일한 판본이며 당시 유행하던 『유서필지(儒胥必知)』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선본(善本)이다.